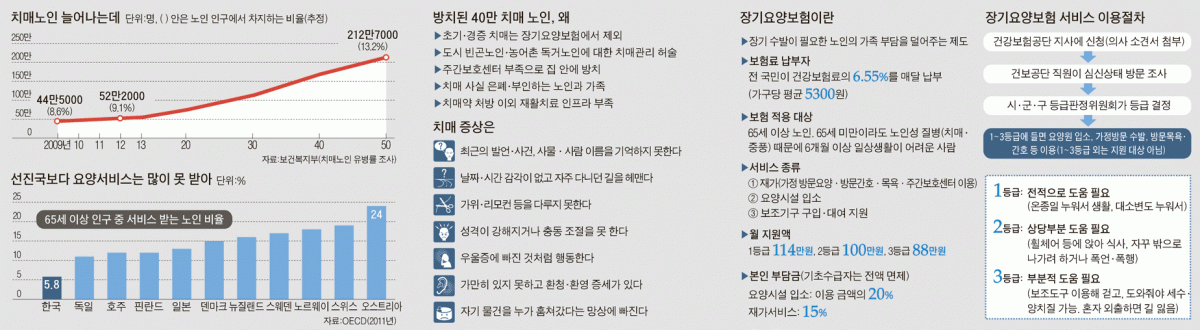치매 노인, 벽에 소변 비비다 조사관 오자…
페이지 정보

본문
중앙일보] 입력 2012.04.19 03:00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88)를 모시고 사는 박순자(45·가명·울산시)씨는 17일 오전 내내 울먹였다.
“내가 왜 이렇게 갇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심더. 억울하고 무기력합니더.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짜증 내는 내 모습을 보면 눈물이….”
박씨는 하루 종일 집 안에 갇혀 산다. 이불에 오줌을 싸고도 “내가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고 소리치며 벽에 오줌을 비비는 시어머니 때문이다. 한 번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 급히 뒤쫓아가 졸졸 따라다녀야 했다. 밤에도 시어머니와 한 방을 쓴다. 문만 열어 놓으면 밖에 나가려고 해 안전고리를 달았다. 이러기를 3년째, 박씨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다. 남편과도 수차례 다퉜다. 하지만 별수가 없다. 시누이도, 남편도 모두 ‘며느리가 해야 할 일’로 돌렸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 어쩌다 한 번씩 찾아와 “집에서 엄마 잘 모셔라”고 큰소리치는 시누이를 원망하는 것도 지쳤다.
장기요양보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큰 기대를 했다. 보험 적용을 받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시어머니를 집 근처 주간보호센터에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2010년 11월 건강보험공단 조사원이 “오늘 며칠이냐”고 시어머니께 묻자 놀랍게도 정확하게 답변을 했다. 덧셈·뺄셈 질문도 마찬가지였다. 낯선 사람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렸다. 건보공단은 “혼자서 걸을 수 있고 숟가락질을 할 수 있다”며 ‘탈락’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봄, 지난 13일에도 다시 신청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요즘같이 꽃이 활짝 필 때면 박씨는 우울증에 빠진다. 등산·나들이가 모두 남의 일이다. 그는 “눈물이 쏟아지고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가을에도 그랬다. ‘다 그만두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아무런 증세가 없었다. 의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16일 큰맘 먹고 정신과 병원 문 앞까지 갔다. 하지만 발길을 돌렸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요양원에 안 보내고) 집에서 모시고 싶은데…”라며 흐느꼈다.
우리나라 노인 11명 중 한 명이 치매를 앓지만 수발 부담은 대부분 가족 몫이다. 2008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이 가족의 부담을 많이 덜긴 했지만 여전히 40만 명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 1~3등급 중증 환자만 요양보험을 적용하는 게 1차 원인이지만 치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 방법도 가족들의 고통을 심화시킨다.
박씨의 시어머니처럼 건보공단 조사원이 방문하면 치매 노인이 긴장해 정신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대전의 한 재가복지센터장은 “평소에는 팔을 꿈적 못하던 노인이 방문객이 오면 잘 움직이고 정신이 또렷해진다.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말했다. 또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치매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대구의 한 치매 할머니는 평소 온순하다가도 갑자기 난폭해지면서 복지관의 문을 부수고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그런데도 조사원이 나올 때는 멀쩡해진다. 그래서 주변에서 할머니의 폭력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제출해 요양보험 3등급을 받았다. 건보공단 정일만 인정관리부장은 “치매 노인을 조사할 때는 보호자의 얘기를 많이 참고한다”며 “조사 방법을 보완해 경증 치매 노인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들의 고통도 심각하다. 경기도 수원의 홍모(71)씨는 4년 전 치매에 걸린 남편(82)을 돌보느라 당뇨 합병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 지난 2월,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진 날 새벽 남편이 집을 나갔다. 홍씨는 “얼어 죽지 않았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당뇨 망막증 때문에 힘들어도 남편 앞에서 힘든 내색을 못 한다”고 말했다.
- 이전글치매에 4년동안 11조 쓴 요양보험 … 그래도 5명 중 4명은 혜택 못 받아 12.04.19
- 다음글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2012년7월1일 시행) 12.03.21